[백석인들을 위한 Tip] 한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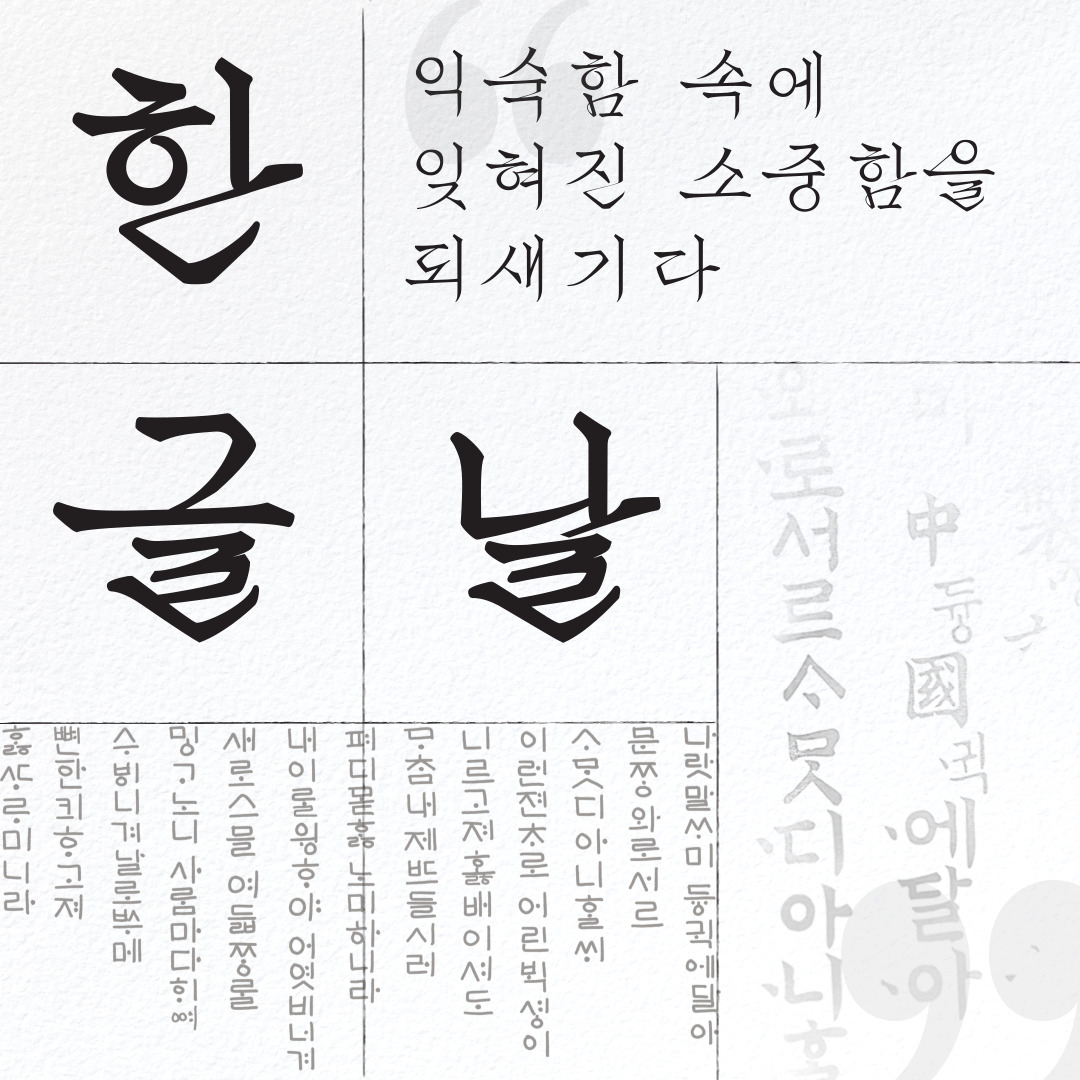
한글날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를 노크(knock)하는 이야기를 담는 기자단, 백녹담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글을 사용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문자를 쓰고 읽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이기에, 한글의 존재는 종종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다.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자, 언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우리의 언어 사용 습관을 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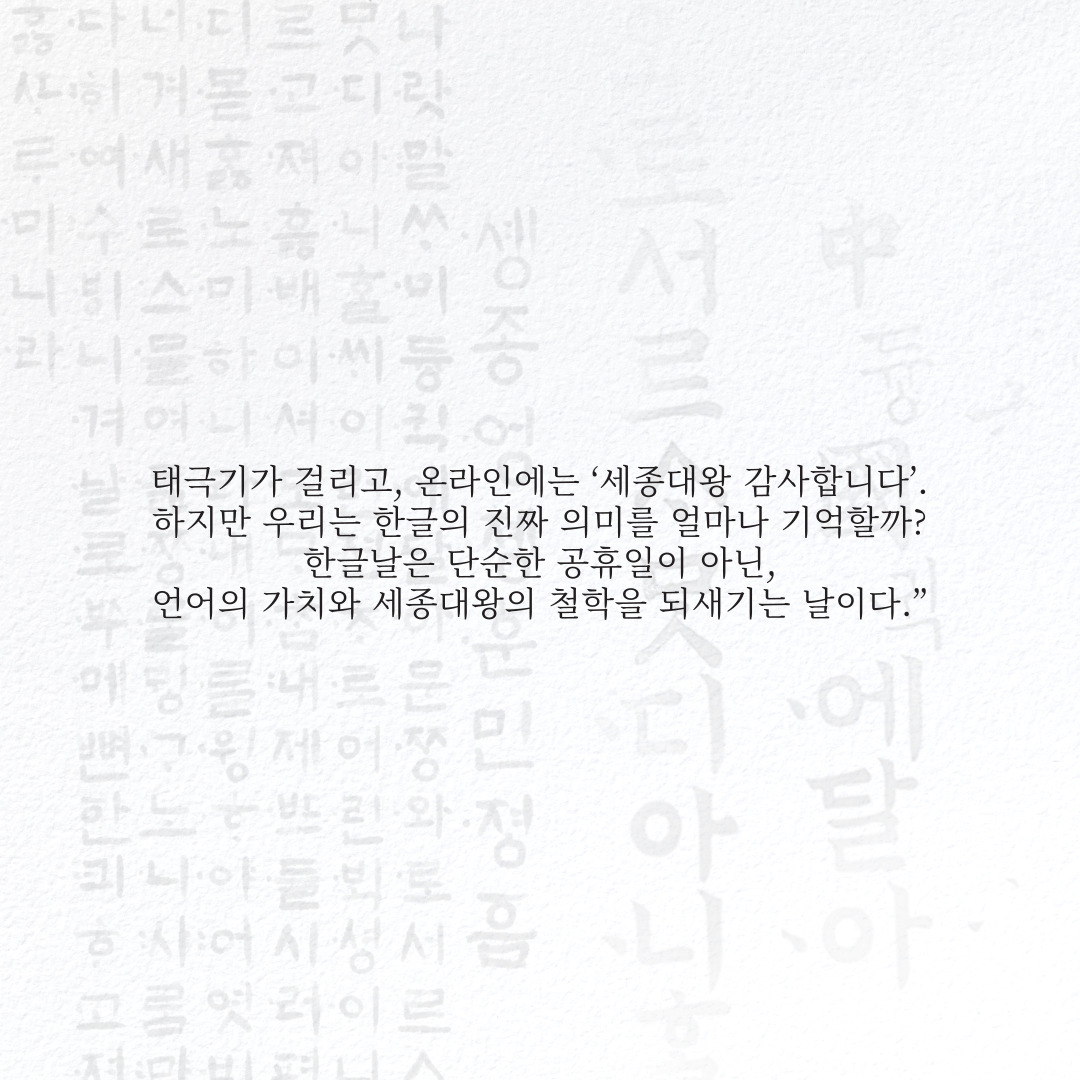
한글날
매년 10월 9일, 우리는 ‘한글날’을 맞이한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걸리고, 온라인에서는 ‘세종대왕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온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날의 진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한글날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날이자,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의 철학을 다시 되새기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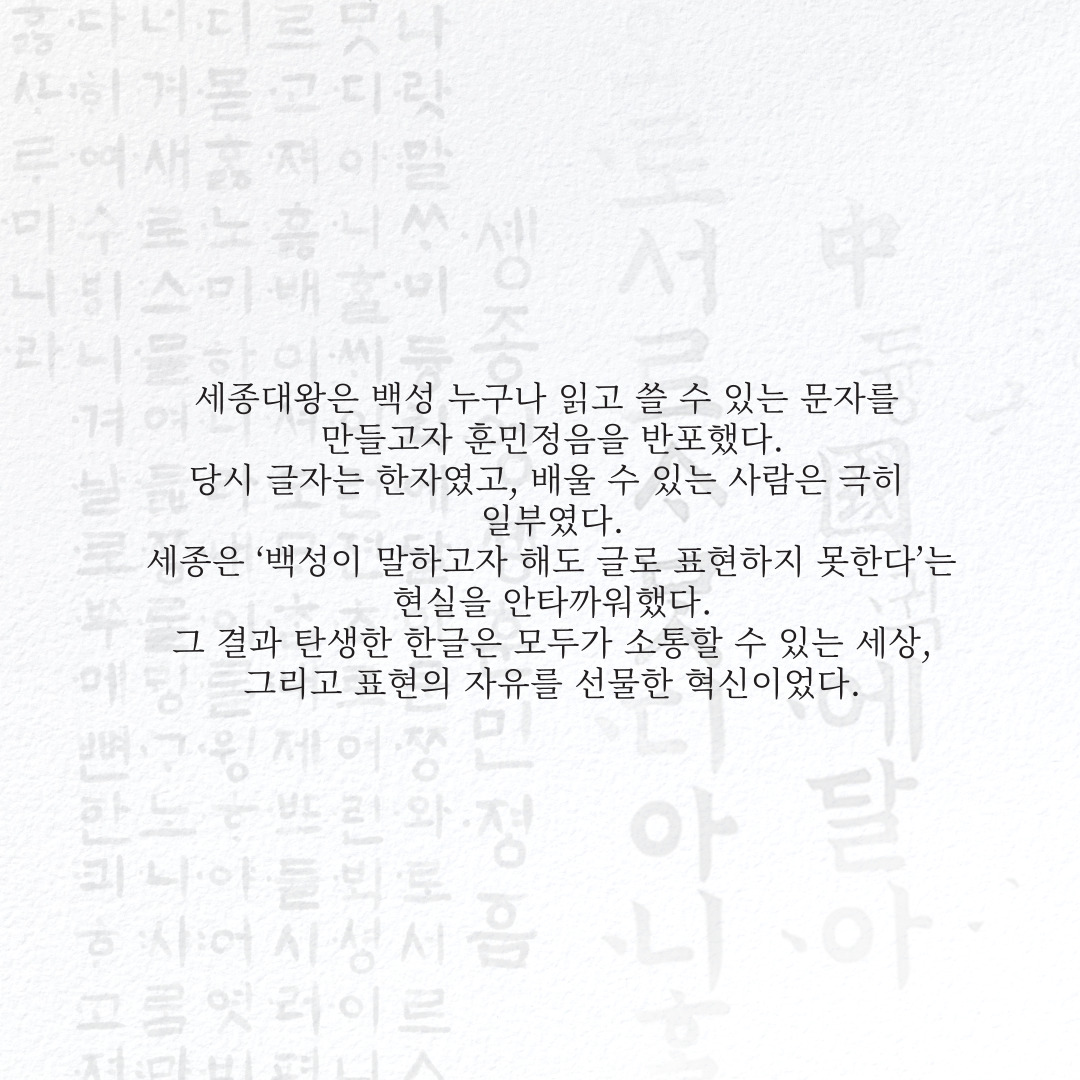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당시의 글자는 한자였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그마저도 문해력이 낮았다. 세종은 이런 현실 속에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라는 문장이 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백성에게 ‘말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돌려준 혁신이었다. 문자 하나가 백성의 삶을 바꾼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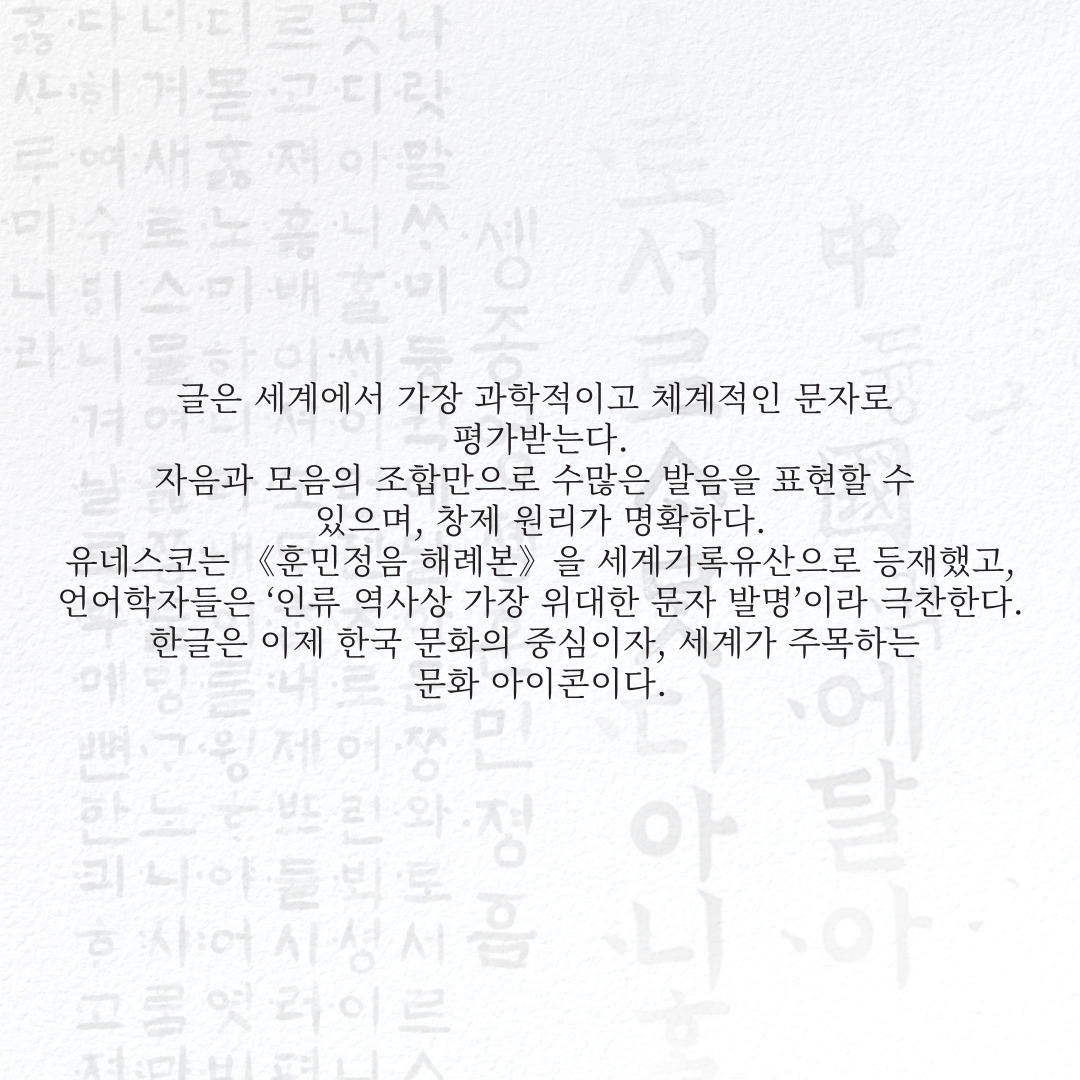
훈민정음 해례본
오늘날 한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평가받는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수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글의 창의성과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외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발명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한글은 지금도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한류 열풍 속에서 문화의 중심에 있다. 케이팝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고, 한글 문양이 패션 디자인에 쓰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자’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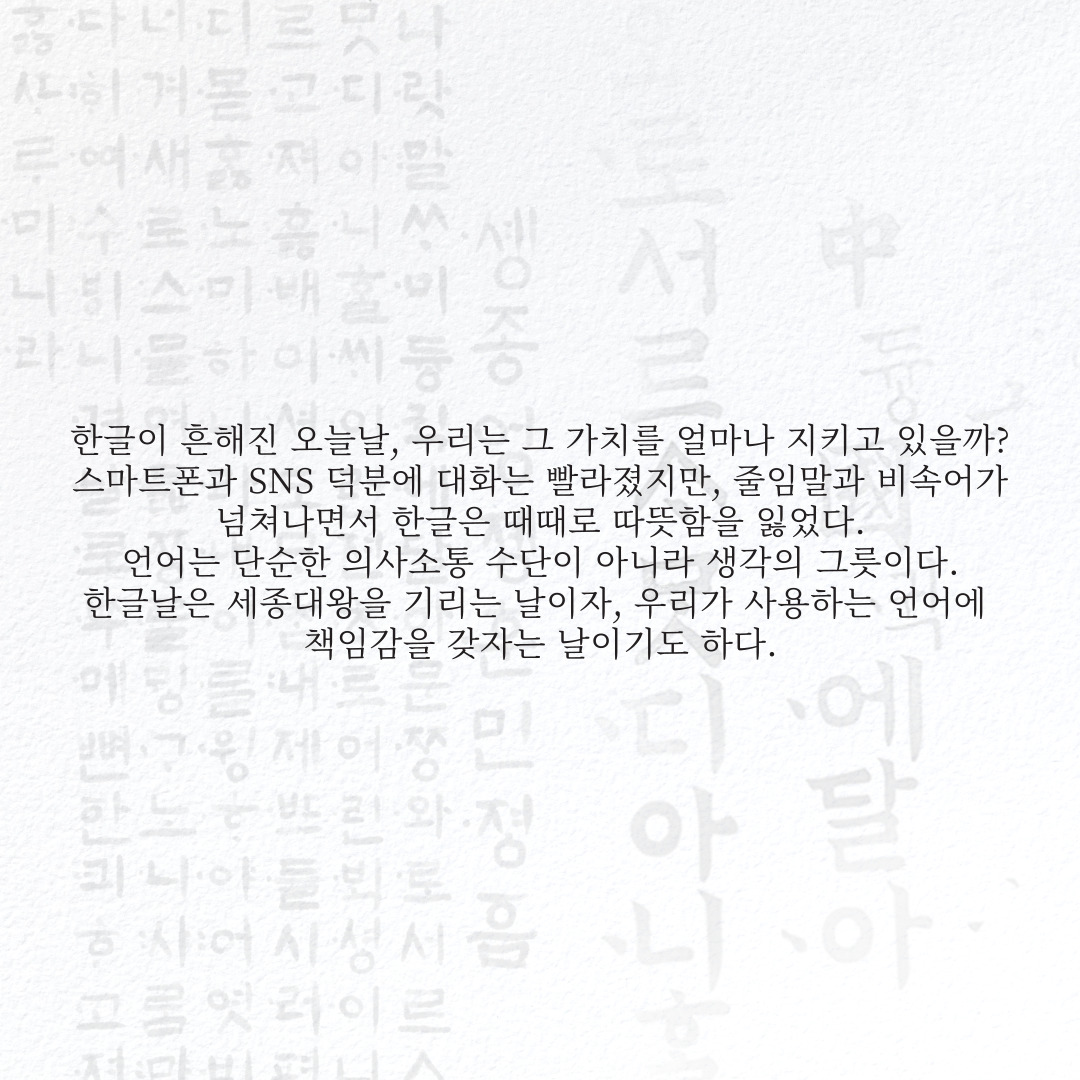
한글날
하지만 그만큼 한글이 흔해진 오늘날,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은 사람들 간의 대화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글의 바른 사용을 흐트러뜨렸다. 줄임말, 비속어, 신조어, 외래어가 넘쳐나는 사이, 문장은 점점 짧아지고 감정은 단어로 압축되었다.
‘ㅇㅈ’, ‘ㄱㅇㄷ’, ‘ㄹㅇㅋㅋ’처럼 자음만 남은 대화는 빠르지만, 때로는 따뜻함을 잃는다. 한글날마다 “한글 사랑합시다”라는 문구가 SNS에 떠오르지만, 정작 우리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각의 그릇이라면, 언어의 빈틈은 사고의 빈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단지 세종대왕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책임감을 갖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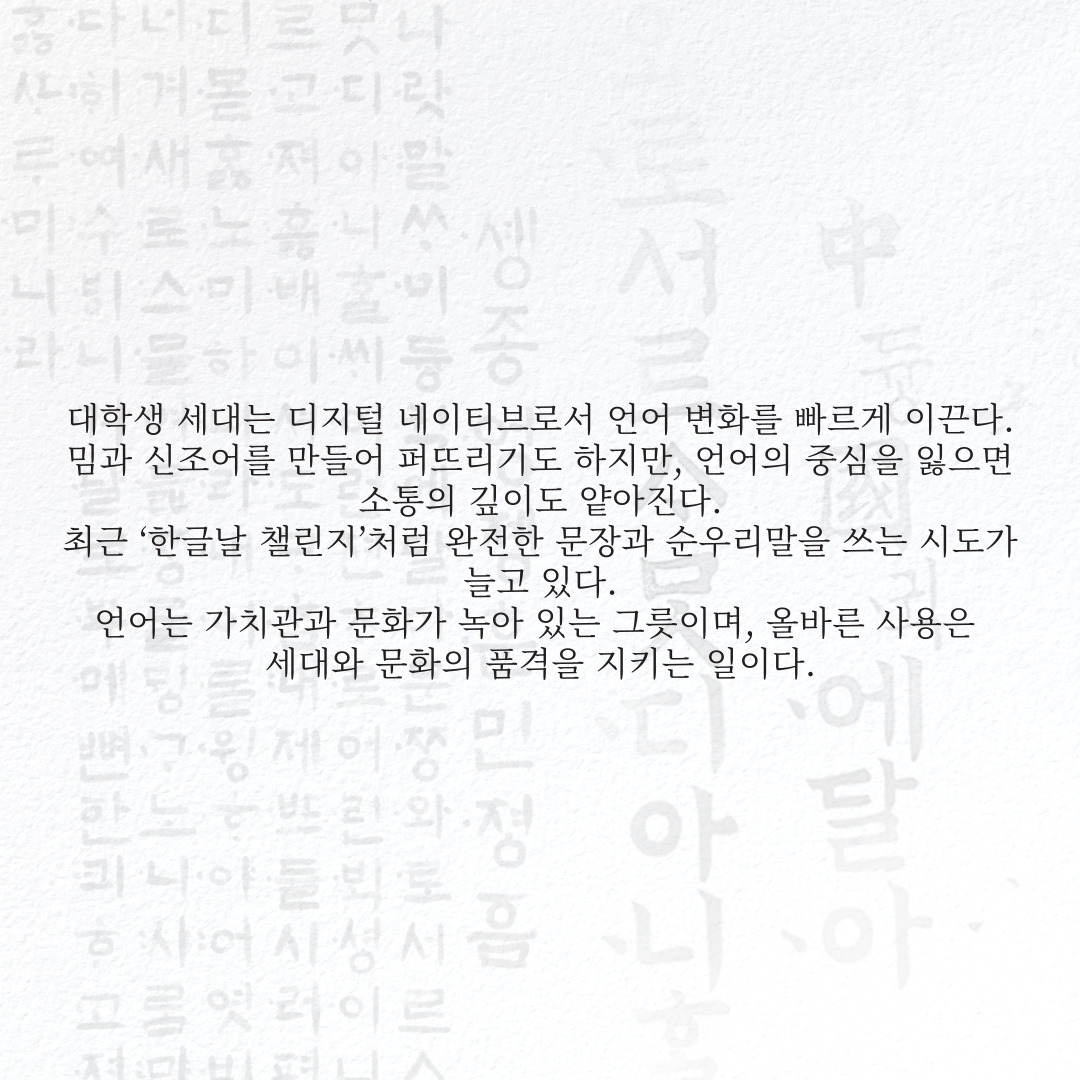
언어 변화
대학생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언어 변화를 가장 빠르게 주도하는 집단이다. 밈이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SNS를 통해 새로운 표현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중심을 잃으면 소통의 깊이도 얕아진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날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줄임말 대신 완전한 문장을 쓰거나, 외래어 대신 순우리말을 찾아 사용하는 캠페인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시도는 언어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예쁘다’ 대신 ‘고운’, ‘행복하다’ 대신 ‘기쁘다’ 같은 단어를 쓰면 문장 속 온도가 달라진다.
언어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가치관, 정체성, 문화가 녹아 있다. 대학생이 언어를 바로 쓰는 것은 곧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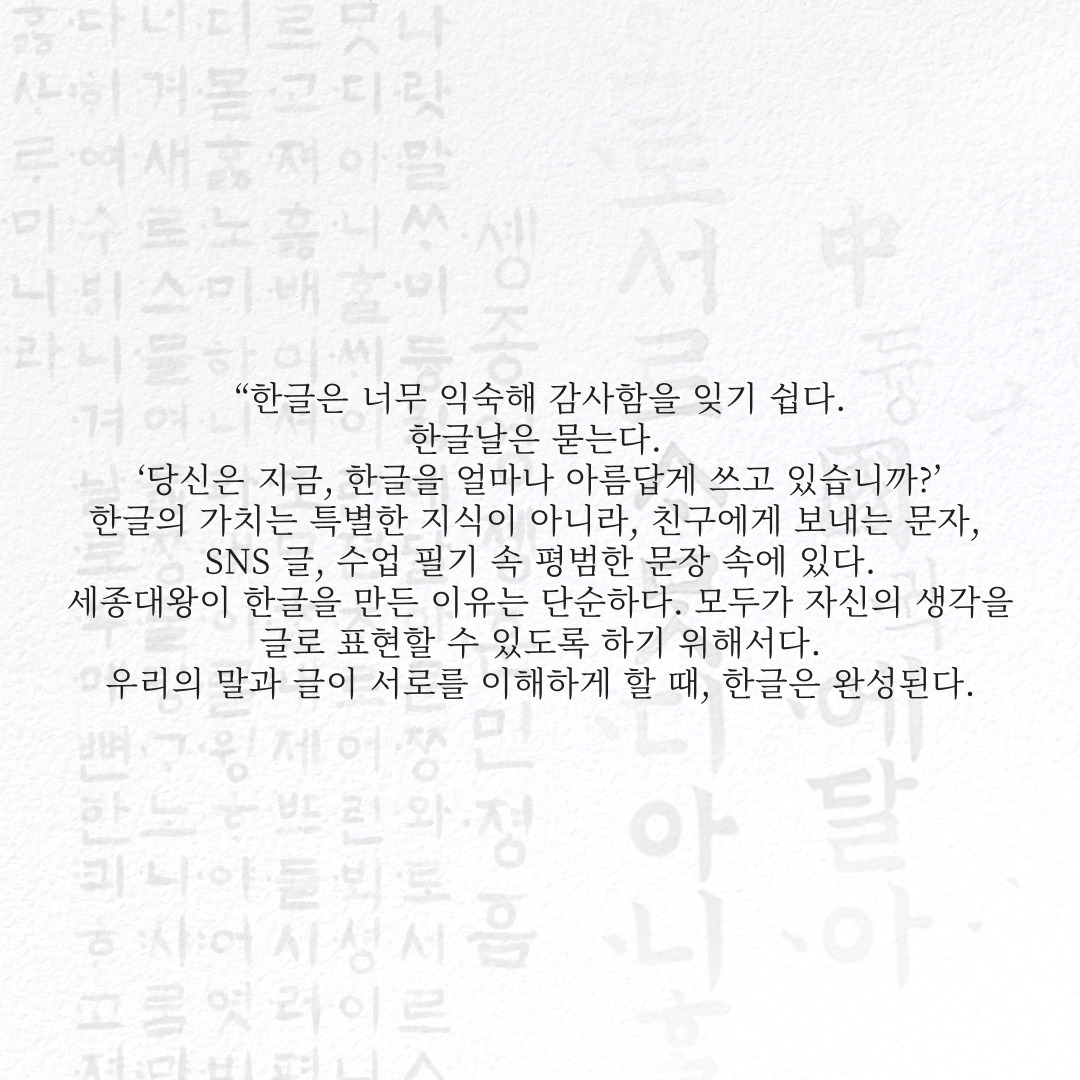
한글날
한글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 태어나자마자 듣고, 학교에서 배우며, 하루 종일 사용하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때로 감사함을 잊게 만든다.
한글날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지금, 한글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까?”
한글의 가치는 특별한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평범한 문장’ 속에 있다.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문자, SNS에 올리는 한 줄 글, 수업 중 필기하는 메모 속에서도 한글은 살아 숨 쉰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단순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의 말과 글이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종대왕의 한글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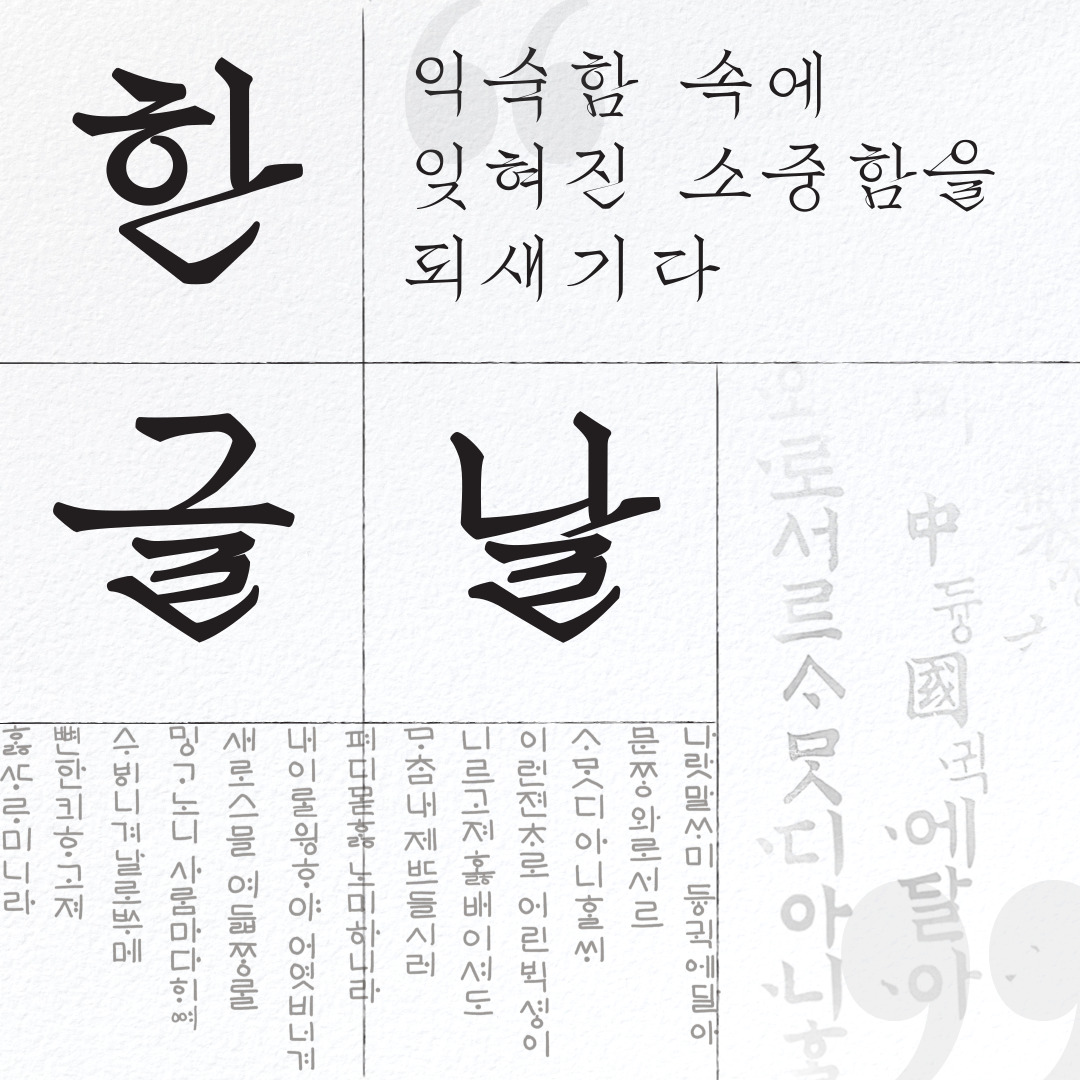
한글날
한글은 세종대왕의 시대에서 탄생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꿈꾸었던 세상은, 단지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글의 본래 가치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짧은 문장, 줄임말, 외래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언어의 깊이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글날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을 통해 세종의 뜻을 이어가는 실천의 날이다. 한글을 바르고 품격 있게 사용하는 일, 그리고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가 세종대왕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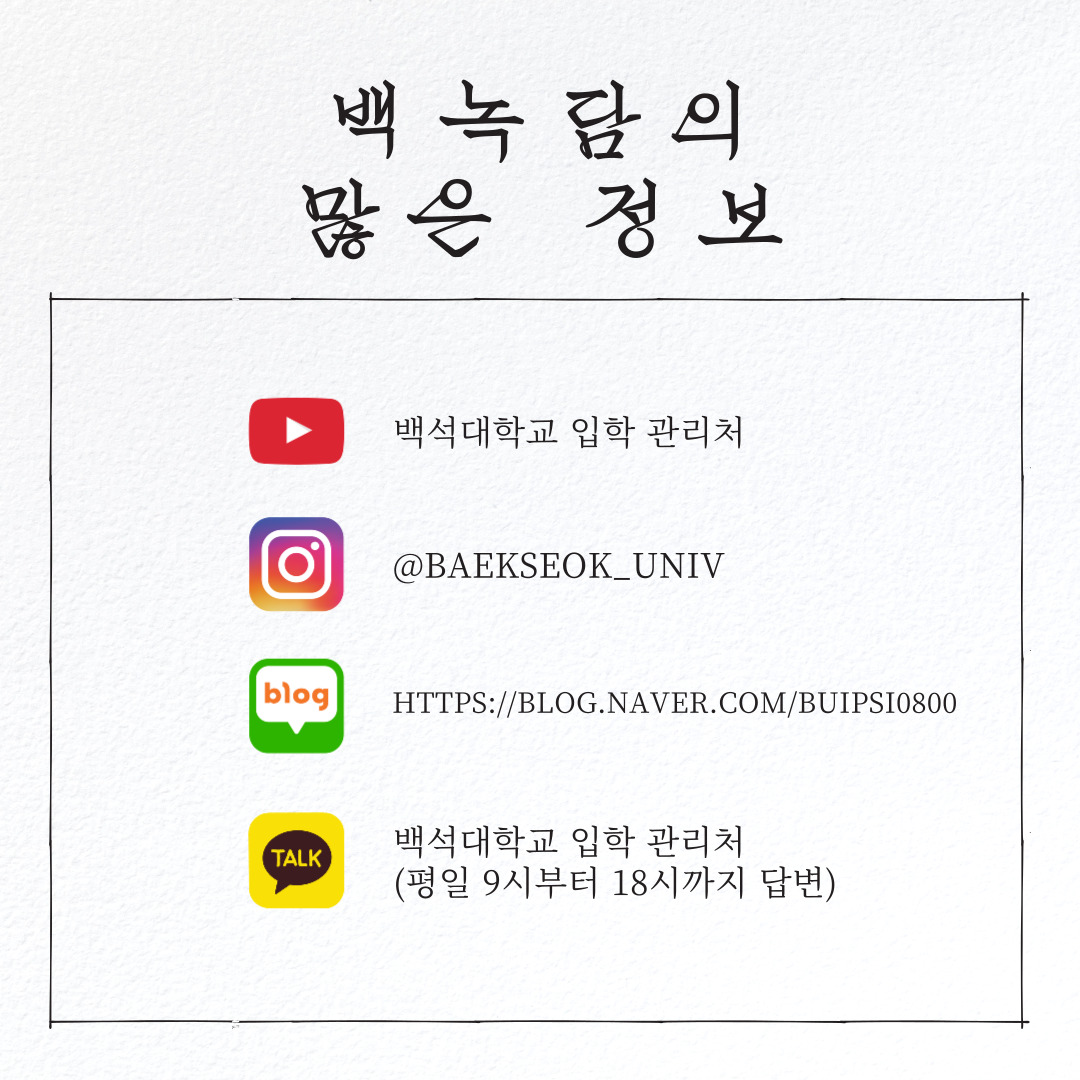
백녹담의 많은 활동
유튜브 – 백석대학교 입학 관리처
인스타그램 - @baekseok_univ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uipsi0800
카카오톡 –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답변)